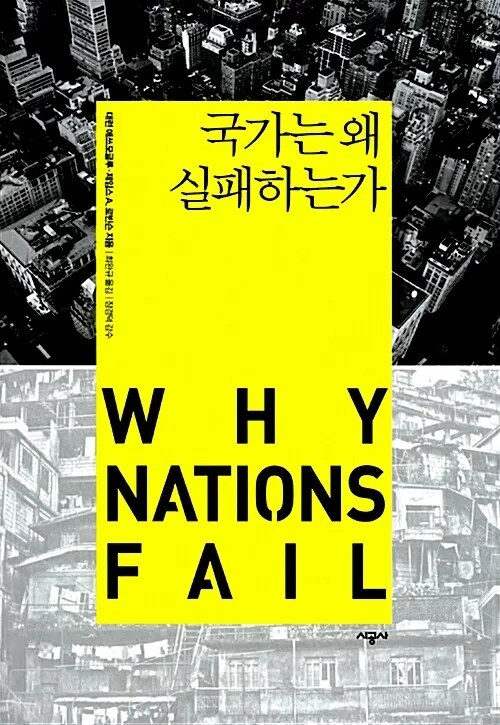쏟아지는 뉴스에 생각이 잘 정리되지는 않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제도의 측면에서 한 번 보고 싶었어요. 잘 될 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해보죠.
비상 계엄이 선포된 날, 저는 마침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이번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대런 애쓰모을루가 쓴 책이죠. 대런 애쓰모을루는 제도 경제학자로 알려져있어요. 제도 경제학은 흔히 알려진 미시 경제의 수요 공급 곡선이나 거시의 이자율 대비 산출 등과는 다르게, 역사 속에서 경제 행동을 결정짓는 제도의 역할을 연구하는 학문이예요. 저도 석사 과정 중에 접하여 매우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그런 질문 하곤 하죠. 왜 어떤 나라는 잘 살고 어떤 나라는 가난한지. 대런 애쓰모을루는 포용적인 제도는 번영을 부르고 착취적인 제도는 빈곤을 부른다고 했어요. 이때 번영과 빈곤은 한 국가의 번영과 빈곤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모두들 포용적인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겠죠?
하지만 모든 나라가 포용적인 제도를 두고도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는 이유는, 착취적 제도 하에서 힘을 가진 소수가 이익을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많은 빵을 골고루 나눠먹으면 풍족하겠지만, 적은 빵을 소수만 나눠먹으면 그 소수도 못잖게 풍족할 거잖아요.
포용적인 제도가 널리 그리고 깊게 뿌리내리면 빵을 독차지하는 경우도 점점 줄어들고, 남의 권력을 빼앗더라도 거기에서 추가로 얻게 되는 빵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도 기억해 둡시다. 권력이 분산된다는 소리겠죠. 민주주의 말입니다.
잠깐 여기서 우리나라를 바라봅니다. 민주화를 이루고 부패를 척결하며 여태껏 한반도에서 보지 못 했던 엄청난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그 길에 경제 위기도 여럿 있었지만 이제는 어지간해서는 무너지지 않을, 그런 힘을 가진 나라가 되었죠. 지난 화요일 밤, 윤석열 내란수괴가 비상 계엄을 외치기 전까지는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잠시 생각해봤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의 3권 분립제도에 아직도 보완할 부분이 있다는 점이예요. 40여년 전에나 있었던 계엄이 우리 앞에 아무렇지 않게 다시 나타났잖아요. 물론 그 과정에서 거부한 군인도 있었고 신속하게 계엄을 해제한 국회도 있었지만, 아직은 계엄이 나타날 여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150년 전의 미국도, 200년 전의 프랑스와 영국에도 그럴 여지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 나라들은 지금은 아니예요.
그 다음이 좀 더 흥미로운데요. 내란수괴를 비롯해 동조자들을 보면 그간 한국의 발전 성과를 조금 더 가져갔으면 가져갔지, 거기서 소외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빵이 커지면서 점점 더 쪼개져가는 과정에서 악화일로를 느낀 것일까요? 땅 속에서 썩어 문드러진 독재의 망령을 되살려오면 다시 그 옛사람들이 거머쥐었다는 집중된 권력, 그 달달한 맛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계엄이 그들의 ‘정상화’로 가는 길이었을까요?
앞으로 또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쯤해서 다행입니다. 끝끝내 그들이 권력을 잡고 나머지 야당과 국민들이 권력에서 소외되는 순간, 그간 달성한 모든 번영은 쇠퇴의 길을 걸을 테니까요. 안 그래도 이미 무능한 한줌의 여당 머리에서 나오는 그 어떤 아이디어도 오천만 국민이 각자 빛날 때 나오는 것에 비할 수 없을 것이고, 심지어 그들의 아이디어는 발전이라고는 없이 이미 있는 것을 탕진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니까요. 우리의 삶도 그들의 탕진파티에 갈려나가겠죠.
하루 빨리 윤내란을 탄핵하고, 책임자들을 처벌하길 고대합니다. 빠른 응징이 그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다음 대통령은 그 다음에 생각해도 돼요. 내각을 구성하지 못 해 벨기에는 거의 2년을 무정부 상태로 지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성숙하고, 성질마저 급하니, 농반 진반으로 벨기에 보다도 훨씬 잘 헤쳐나갈 것으로 봅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질 않네요. 각자 다른 어려움이 있겠지만 부디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