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이 세계를 휩쓸자 회사에서는 사무실 책상과 의자를 집으로 배달해 주었어요. 그 전까지는 적당히 이케아 가구로 꾸며두다가, 그 이후로 큼지막한 책상도 집에서 써보고 서재를 정말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이사를 한 지금도 집무실로 쓰는 공간은 마련해 두었지만, 아직 자리를 잡지 못 한 상태예요. 손님용 방에 책상을 들여놓은 모습에 가깝달까요.
도서관에 비치된 ‘아무튼’ 시리즈를 둘러보다가 목수가 꿈 꾸는 서재는 무엇일까, 뭔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아무튼, 서재’를 빌려오게 되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저자인 김윤관님도 아직 완벽한 서재를 꿈꾸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공간의 사이즈, 적절한 책장의 모양, 책상의 크기, 의자의 편안함 등등 저보다는 매우 구체적으로 말이죠. 제가 가진 공간과 가구 구성을 떠올리며 읽어봤는데요. 일단 저는 책장은 들이기 전이고, 책상은 말씀하신 대로 사람과 가까운 따뜻한 나무 대신 현대적이고 사무적이죠. 하얗고 거대하거든요. 따스함은 느껴지지 않아도 높이 조절이 되어 제 척추에 매우 관대하고 따수운 존재긴 하지만요.
서재를 사적인 공간으로 정의한 것이 인상적이었는데, 책장과 따로 두라는 조언을 저도 채택해볼까 합니다. 집무실을 책상을 위주로 하는 창의와 재생의 공간으로 만들고, 책장은 거실에 두어 도서관 기능을 하도록 해두는 것이죠. 저의 대수롭지 않은 장서 수 덕에 도서관 보다는 벽장에 가까울 거예요.
가구에 대한 고찰 후에는 서재라는 것의 존재를 짚어보는 부분도 나오는데요. ‘여성들의 책 읽기’가 권위에 휘둘리지 않는, 자신과 주변을 이해하는 친근한 독서라는 설명을 하면서도, 아래와 같이 선명하게 묘사한 것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성들의 비열한 방해 속에서도 여성들 은 책을 읽고 글을 썼으며, 그 과정을 통해 결국 자신 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다. 여성들은 한 손에는 책을, 한 손에는 립스틱을 든 채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남자들의 바람에도 불 구하고 여성들은 다시 뒤를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또 조선이 500년 이상 존속할 수 있었던 비결로 선비를 들며, 그들의 수행이 결국은 서재가 있어서 가능했음을 설명한 부분은 신선했습니다. 다만, 실용적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선비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다소 이상화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세상이 바뀌는 줄 모르고 옛날의 방식을 고수하고 책만 들고 파다가… 우리 선조들이 오랫동안 고생을 한 것을 너무도 많이 들은 탓입니다.
후에 제가 ‘홈 오피스’라고 부르는 공간을 재정비할 때, 한 번 떠올려보는 책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심미적으로, 기능적으로 서재는 무엇이 되어야한다고 접근하는 방식이 마음에 오래 남을테지요. 서재를 꿈꾸는 분들은 꼭 한 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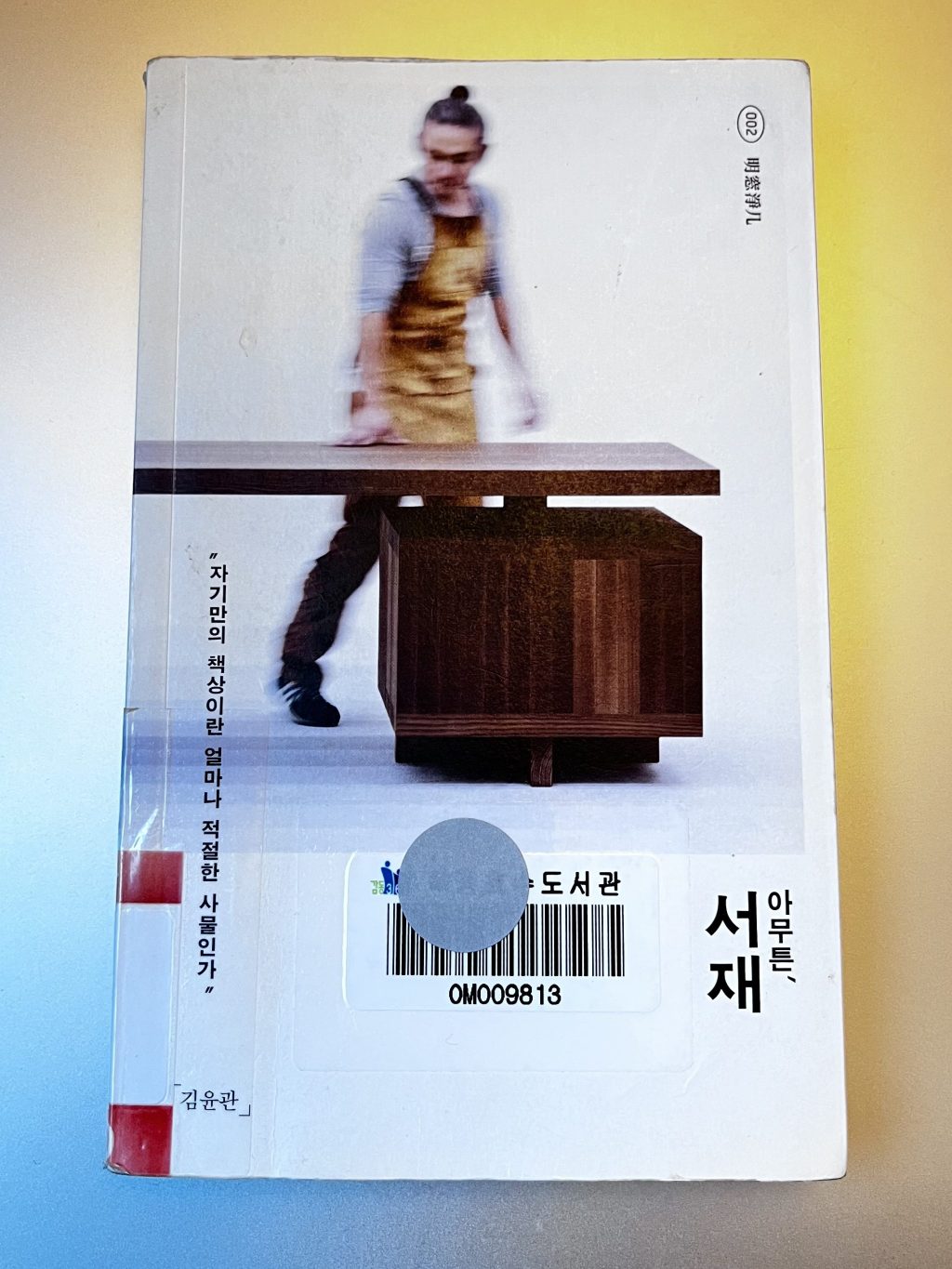
댓글 남기기